축제 뉴스

(조문환의 지리산별곡 1)
지난 4년여 동안 <평사리 일기>를 연재해 왔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자 <조문환의 지리산 별곡>을 연재합니다. 1년 6개월여에 걸쳐 돌았던 지리산 둘레길과 그의 품으로의 여정을 약 24회로 나누어 독자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조문환 _ 여행작가, 시인, 2012년 《시골공무원 조문환의 하동편지》출간을 계기로 글쓰기를 시작, 에세이 《네 모습 속에서 나를 본다》, 사진 에세이집 《평사리 일기》를 세상에 내놓았다. 지난해에는 첫 시집 <바람의 지문>을 출간하였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길을 향하여!
(하동군 악양면 입석~미동마을)
섬진강은 나에게 물처럼 살라고 가르침을 주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본질을 배우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가고 굽은 길은 굽은 길대로 갈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모난 나의 모습들이 이만큼 깎이었나 싶다.
그래도 이 모습이면 내 과거의 모습이 어땠는지 짐작이 가시리라!
산과 강은 그 근원이 하나라는 것은 산을 가보면 금방 깨닫게 된다.
산이 없는 강이 있을 수 있을까?
산 또한 강이 있을 때 산이 그 존재의 가치가 있을 것이다.
세상에 나 홀로의 존재는 있을 수 없을 테니까…….
내가 사는 곳 지리산자락 악양면 봉대길 100번지,
형제봉의 배꼽정도에 자리 잡고 눈앞에는 평사리들판이 펼쳐져 있다.
건너편에는 지리산의 엄지발가락인 구재봉(龜在峰)이 섬진강에 두 다리를 담근 채 눈을 껌뻑이고 있다.
봉대길로 난 작은 사립문을 열면 지리산둘레길이 잘록한 허리를 돌리려 한다.
지리산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
지리산을 돌아보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었다.
어디로 간들 지리산이 날 반겨주고 껴안아 줄 것 같은 마음이었다.
봉대길 100번지에서 둘레길을 걷는 길은
형제봉을 넘어 화개면 부춘을 지나 구례와 남원으로 가는 북서방향과
평사리를 지나 구재봉을 넘어 삼화실과 옥종면 위태와
산청군과 함양으로 돌아가는 남동방향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생리상 후자를 선택하고자 했다.
피날레를 멋지게 장식하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언젠가 둘레길을 다 돌고 형제봉에 올라서서 섬진강과 평사리를 가슴에 안고
멋지게 한번 뛰어내려 보리라…….”
장도에 나서는 나를 평사리들판의 부부송은 환송을 해 주는 듯하였고
대봉감으로 유명한 대축마을을 지나 문암송(文岩松)에 도달하니
평사리들판이 발에 밟히는 듯하다.
마를 대로 마른 감나무를 보니 어떻게 저렇게 앙상한 가지에서
임금님을 감동시켰던 감이 열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문암송은 늘 감동이다.
바위 틈 속에서 태어난 태생적 문제를
바위와의 공생을 통하여 바위도 살고 나무도 사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구재봉활공장 옆구리를 돌아가는 모퉁이 낙락장송 사이로
평사리들판이 마치 아라비아 양탄자를 펼쳐 놓은 듯 하고
섬진강은 그 호쾌한 몸놀림으로 화개장터를 지나 노고단으로 뻗어있다.
섬진강만 바라다보면 늘 내 마음은 싸하다.
그와 함께한 지난 1년, 눈보라를, 폭풍우를
그리고 뙤약볕을 같이 했었던 일종의 동료의식과 같은 것이리라!
눈 빛 만으로도 다 알아챌 수 있는 사이가 되었으니까…….
형제봉 아래에는 마을들이 나른할 정도로 평안하게 누워있다.
외둔, 상평과 하평, 봉대, 대축, 입석, 정서와 정동마을…….
위대한 지리산 형제봉이 나를 품고 있다.
저 속에 내가 누울 자리가 있고 내가 숨 쉴 바람이 불어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작은 오솔길로 난 이웃집들,
돌담 넘어 나와 꼭 같은 형제들이 살고 있다.
그들 모두를 품어주고 모든 현상과 상황들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지리산이 맺어준 인연들이다.

저 위대한 산, 태곳적부터 우리는 인연이었다.
지리산이 없었다면 아예 우리는 이렇게 맺혀질 인연이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지리산형제들이다.
구재봉을 돌아서려니 형제봉은 이미 마블링 기법처럼
곳곳에 무채색 그림자가 능수능란한 터치로 휘갈기는 모습을 연출한다.
이 구재봉을 돌아서면 산청, 함양, 남원을 지나 구례로 오기까지는
섬진강을 당분간 보지 못할 것에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그 섬진강 위로 백운산을 넘어가는 태양이
노고단과 형제봉을 향하여 강열한 조명을 내리 비춘다.
강에는 이미 짙은 산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조명이 내리쬐는 산 정상부위에는 총천연색 영화라도 상영되는 듯 찬란하다.
잘록한 산허리를 돌아가니 미동마을이다.
섬진강을 늘 마주보고 있어 섬진강과는 이심전심이리라.
미루나무에 연한 태양빛이 걸려있다.
저 가지를 통과해야 태양은 잠에 들 수 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둘레길,
나는 그 속에서 나의 작은 시작의 발걸음을 떼었다.
나의 삶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누군가 살아왔던 삶의 연속임을,
언젠가 끝날 나의 인생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누군가 연결해서 살아갈 것임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길을 함부로 걷지 말아야 할 것임을 기억하면서…….
섬진강위로 실 빛 햇빛이 미동마을 위 미루나무가지에 스며든다.


공감가는 이야기 항상 잘 읽고있습니다 앞으로 24회 연재 기대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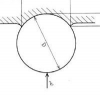
그길을 따라 나도 한 번 걷고 싶네요~ 혼자서 어린 시절 생각하며 ..

문암송 배울게 많은 소나무군요 어쩌다 그런곳에 씨가 뿌려졌을까 평생을

지리산 섬진강 평사리 한국인이 가보고싶은곳 1위일겁니다 이젠 저도 이 연재글을 읽고 하동 거의 줄줄꿸 정도입니다

드디어 다시 펜을 잡으셨군요 지리산별곡 첫회부터 짜한 회귀본능 자극해 주시는군요
